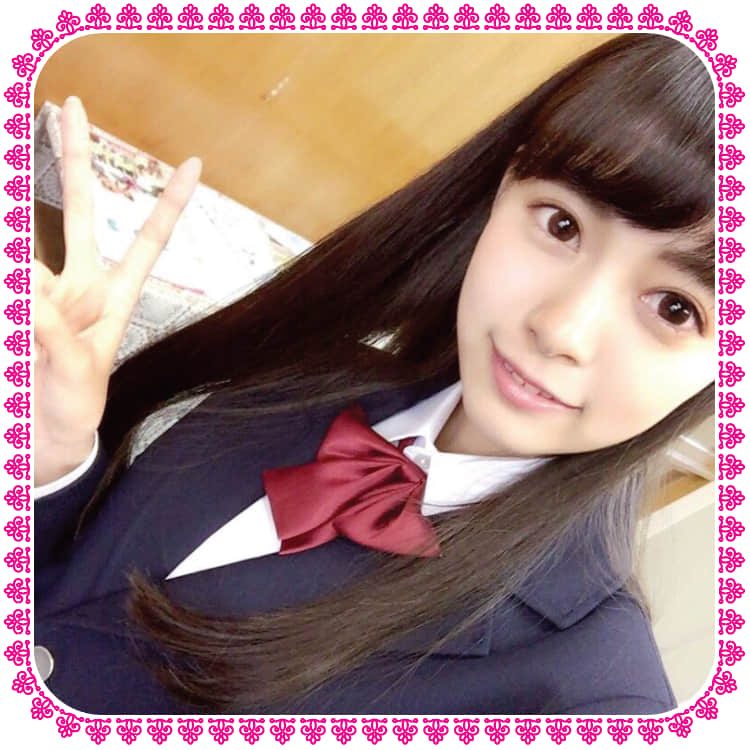나는 러버다.
러버 생활을 오래 하면서 깨달은 게,
많은 씨시들이 러버와 함께 있을 때 수치심과 부끄러움,
그리고 험하게 다뤄지는 능욕을 좋아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씨시들의 옷을 내 손으로 직접 벗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때론 그녀들 스스로가 내 앞에서 옷을 하나씩 벗으며 스티립하는 모습을 보는 것을 더 좋아한다.
“야! 이 썅년아. 얼른 벗어!” 라고 맘에 없는 말을 하기도 한다.
그러면 그녀들은 깜짝 놀라며,
“네. 알겠어요. 주인님.“ 라고 말하며 하나씩 옷을 벗는다.
이제 발가벗겨져 알몸이 된 그녀를 모텔 바닥에 그대로 꼼짝 않고 서 있게 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눈으로 알몸 구석구석을 감상하며 유린하거나,
“좋은 몸매다. 욕정을 돋구는데? 자 그럼 이번에는 뒤돌아서 그 매력적인 구멍도 한번 보여줘 봐.” 라든지
“같은 남자 앞에서 벌거벗겨져 알몸으로 눈요기를 당하는 기분을 좀 말해 봐.” 라고 묻기도 한다.
그럼 시디들은 정말로 수치스러운지,
아니면 일부러 수치스러운 척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온통 새빨개진 얼굴을 하고서 그리고 다소곳한 자세로,
“네. 부끄러워요. 하지만 좋아요. 제가 여자라서 너무 행복해요. 저를 꼭 안아주세요. 주인님.” 라고 말하며
뒤돌아선 채 허리를 크게 숙여 엉덩이를 보여준다.
그때 나는 최고의 행복감을 느끼며 그녀의 엉덩이 한 가운데에 키스를 해준다.
아침 10시,
지금 나와 그녀는 침대에 누워 아침 섹X 후의 노곤함을 달래고 있다.
조금 전 격렬한 섹X를 마친 후 그녀를 품에 안은 채,
그녀의 젖꼭지와 작고 귀여운 그것을 만지작거리며 섹X 뒤에 찾아오는 아릿한 여운을 즐기고 있다.
그녀는 이제 처음의 어색함은 뒤로하고 더욱 자연스럽게 나에게 몸을 맡기고 있다.
아…내겐 너무나 귀여운 씨시년들 같으니라고…
어쩌다 이런 것들이 세상에 존재해서,
러버인 우리들을 즐겁게 해주는지…
그냥 콱 깨물어 주고 싶다.